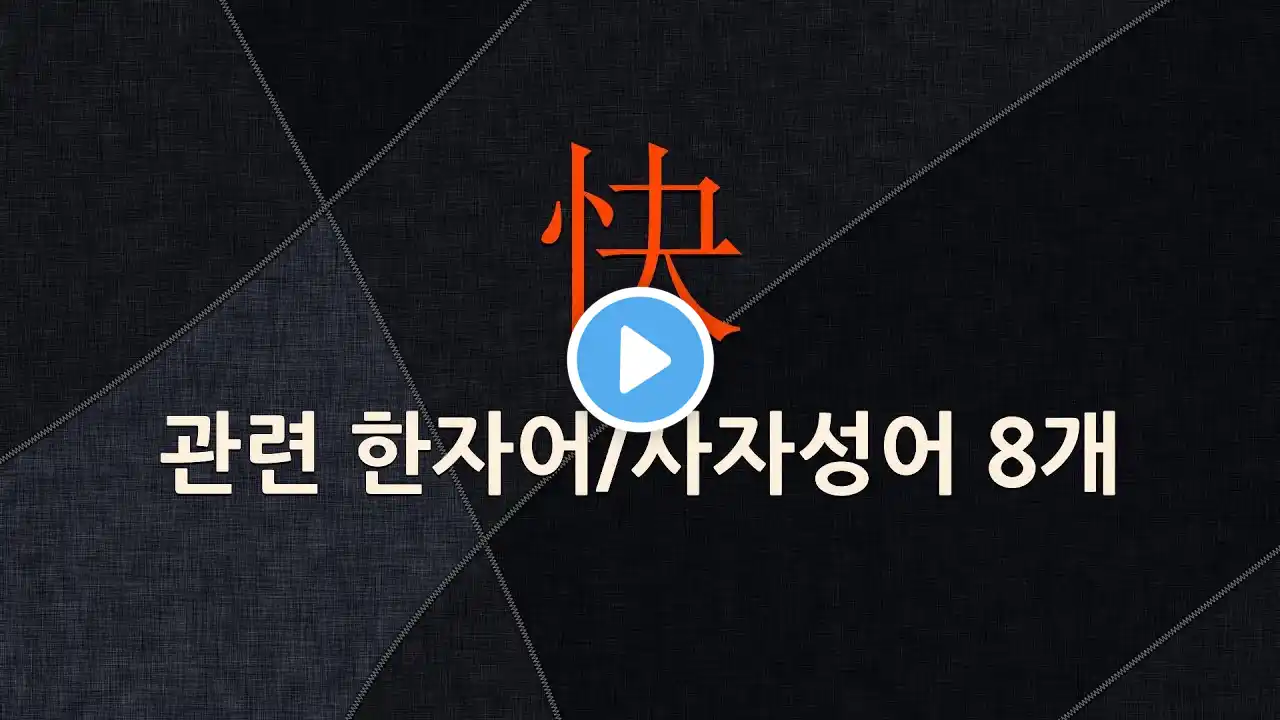속담에 관한 한자어/사자성어 63개
속담에 관한 한자어 및 사자성어를 자세하게 풀이해 드립니다. [속담에 관한 한자어/사자성어 목록: 63개] 1) 齒亡脣亦支(치망순역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속담(俗談)의 한역으로, 있던 것이 없어져서 불편(不便)하더라도 없는 대로 참고 살아간다는 말. 2) 測水深昧人心(측수심매인심): 물 속 깊이는 알아도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는 속담(俗談)의 한역으로,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말. 3) 知斧斫足(지부작족):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뜻의 우리말 속담을 한역한 것으로, 믿는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4) 十伐之木(십벌지목): 열 번 찍어 베는 나무라는 뜻으로,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음을 이르는 말. 5) 積功之塔不隳(적공지탑불휴): 공든 탑이 무너지랴의 속담(俗談)의 한역. 6) 逐鷄望籬(축계망리):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는 뜻으로, 애써 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남보다 뒤떨어져 맥이 빠진 경우를 이르는 말. 7) 於異阿異(어이아이): ‘어 다르고 아 다르다’는 우리말 속담의 한역(漢譯)으로,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 상대가 받아들이는 기분이 다를 수 있다는 의미나, 항상 말을 조심해서 해야한다는 의미. 8) 老馬厭太乎(노마염태호): 늙은 말이 콩 마다 하랴라는 속담(俗談)의 한역으로, 본능적(本能的)인 욕망(慾望)은 늙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 9) 獨木橋冤家遭(독목교원가조): 원수(怨讐)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속담(俗談)의 한역으로, 회피(回避)할 수 없는 경우(境遇)를 가리킴. 일이 나쁜 형태(形態)로 공교(工巧)롭게 마주치는 것을 이르는 말. 10) 冶家無食刀(야가무식도): 대장간에서 식칼이 논다는 뜻으로, 생활에 쫓겨 남의 바라지만 하고 정작 제 집엔 등한시한다는 의미나, 마땅히 흔해야 할 곳에 도리어 그 물건이 부족하거나 없는 상황을 이르는 의미를 지닌 한역(漢譯) 속담. 11) 吾鼻三尺(오비삼척): 내 코가 석 자라는 뜻으로, 자기 사정이 급하여 남을 돌볼 겨를이 없음을 이르는 말. 12) 汝墻折角(여장절각): 너의 담장이 뿔을 부러뜨렸다는 뜻으로, 네 집 담장이 없었으면 내 소의 뿔이 부러지지 않았을 거라고 우겨대는 것처럼 자기 잘못으로 생긴 손해를 남에게 넘겨씌우려고 트집 잡는 속담을 한역한 말. 13) 談虎虎至(담호호지): 호랑이도 제 말을 하면 온다는 뜻으로, 이야기에 오른 사람이 마침 그 자리에 나타남을 이르는 말. 14) 虎前乞肉(호전걸육): 호랑이 앞에서 고기를 구걸한다는 뜻으로, ‘범에게 고기 달래기’로 표현하는 어림도 없는 일을 계획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우리나라 속담. 15) 査頓八寸(사돈팔촌): 사돈의 팔촌이라는 뜻으로, 소원(疎遠)한 친척으로 남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비유하여 이르는 우리나라 속담. 16) 臂不外曲(비불외곡): 팔은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지 않음을 이르는 말. 17) 村鷄官廳(촌계관청): 촌닭을 관청에 잡아다 놓은 것 같다는 뜻으로, 경험이 없는 일을 당하여 어리둥절하고 있음을 이르는 말. 18) 耳屬于垣(이속우원): 담에도 귀가 달려 있다는 뜻으로, 남이 듣지 않는 곳에서도 말을 삼가야 함을 이르는 말. 19) 生巫殺人(생무살인):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는 뜻으로, 미숙한 사람이 일을 그르침을 이르는 말. 20) 三年狗尾不爲黃毛(삼년구미불위황모): 개 꼬리 삼년 묵어도 황모 못 된다는 속담(俗談)의 한역으로, 바탕이 못된 것은 세월(歲月)이 꽤 흘러도 좋아지지 않는다는 말. 21) 太守爲脫頷頤(태수위탈함이): 태수 되자 턱 빠진다는 속담(俗談)의 한역으로, 오랜 노력(努力)이 모처럼 결실을 보자, 복이 없어 허사가 된다는 말. 22) 死後藥方文(사후약방문): 죽은 뒤에 약방의 처방문이라는 뜻으로, 때가 이미 지난 뒤에 대책을 세우거나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과 통용. 23) 適口之餠(적구지병): 입에 맞는 떡. 24) 看晨月坐自夕(간신월좌자석): '새벽달 보자고 초저녁부터 나와 앉아 있으랴'라는 속담(俗談)의 한역으로, 주책없이 너무 일찍부터 서두름을 이르는 말. 25) 西瓜皮舐(서과피지): 수박 껍질 핥기라는 뜻으로, 우리말 속담 ‘수박 겉핥기’의 한역인데, 사물의 속 내용은 모르고 겉만 건드리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사용됨. 26) 杵孫(저손) 27) 我歌査唱(아가사창) 28) 鯨鬪鰕死(경투하사) 29) 我刀入他鞘亦難(아도입타초역난) 30) 凍足放尿(동족방뇨) 31) 堂狗三年吠風月(당구삼년폐풍월) 32) 竿頭過三年(간두과삼년) 33) 見奔獐放獲兎(견분장방획토) 34) 壁有耳(벽유이) 35) 豐年化子(풍년화자) 36) 無病自灸(무병자구) 37) 姑息之計(고식지계) 38) 燈下不明(등하불명) 39) 隔靴搔癢(격화소양) 40) 量衾伸足(양금신족) 41) 同價紅裳(동가홍상) 42) 久旱甘雨(구한감우) 43) 黑狗逐彘(흑구축체) 44) 皮匠花草(피장화초) 45) 咆虎陷浦(포호함포) 46) 獨掌不鳴(독장불명) 47) 藁網捉虎(고망착호) 48) 豊年花子(풍년화자) 49) 堂狗風月(당구풍월) 50) 鯨戰蝦死(경전하사) 51) 鷄卵有骨(계란유골) 52) 兩手執餠(양수집병) 53) 追友江南(추우강남) 54) 乞人憐天(걸인연천) 55) 如狗食藥果(여구식약과) 56) 盲玩丹靑(맹완단청) 57) 推己及人(추기급인) 58) 猫頭懸鈴(묘두현령) 59) 借廳借閨(차청차규) 60) 避獐逢虎(피장봉호) 61) 虎尾難放(호미난방) 62) 覆車之戒(복거지계): 앞의 수레가 엎어지는 것을 보고 뒤의 수레는 미리 경계하여 엎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뜻으로, 남의 실패를 거울삼아 자기를 경계함을 이르는 말. 63) 亡羊補牢(망양보뢰): 양을 잃고 우리를 고친다는 뜻으로, 이미 어떤 일을 실패한 뒤에 뉘우쳐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이르는 말. 원래는 양을 잃은 뒤에 우리를 고쳐도 늦지 않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실패해도 빨리 뉘우치고 수습하면 늦지 않는다는 말로 쓰였으나 현재는 주로 이와 같이 쓰이고 있다. [Credits] Contents: https://wordrow.kr/한자/속담에-관한-한자-한자성어-... Background music: Bensound https://www.bensound.com/royalty-free...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및 공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