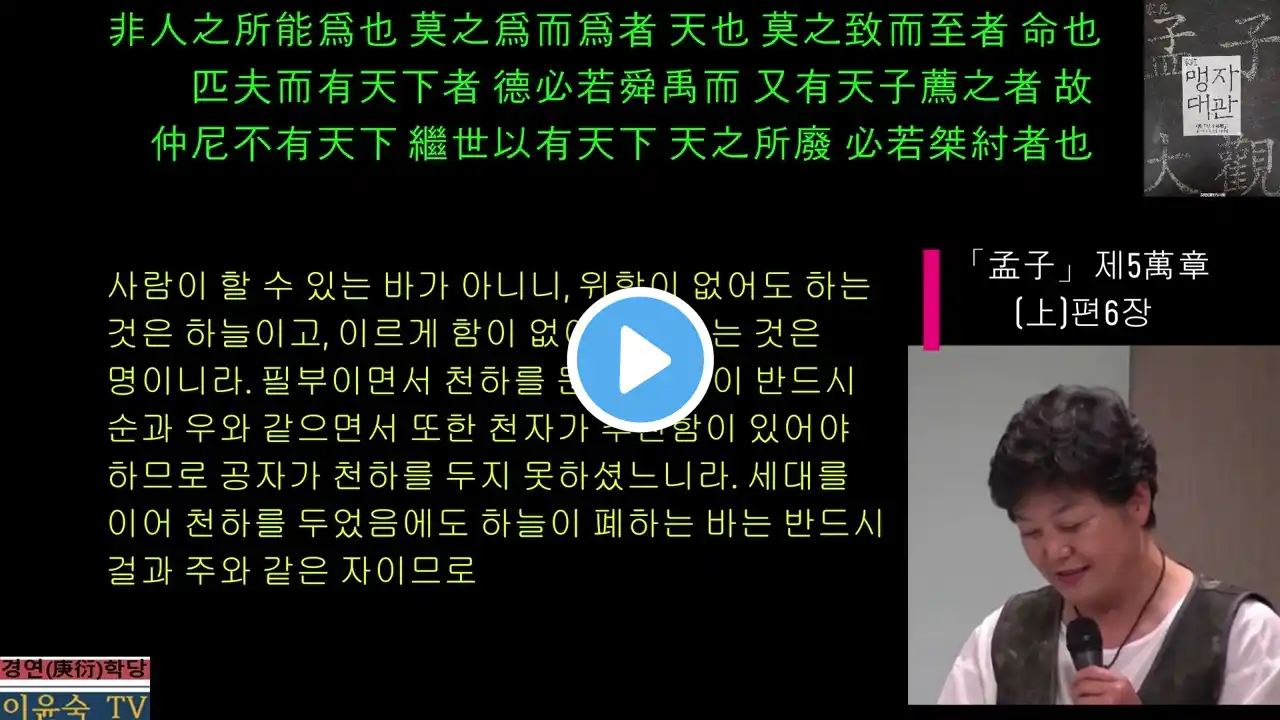(5-上-9) 「孟子」 제5萬章(만장上)편9장
萬章이 問曰或曰百里奚 自鬻於秦養生者하여 五羊之皮로 食牛하여 以要 秦穆公이라하니 信乎잇가孟子 曰否라 不然하니라 好事者 爲之也니라 百里奚는 虞人也니 晉人이 以垂棘之璧과 與屈産之乘으로 假道於虞하여 以伐虢이어늘 宮之奇는 諫하고 百里奚는 不諫하니라 知虞公之不可諫而去之秦하니 年己七十矣라 曾不知以食牛로 干秦穆公之爲汙也면 可謂智乎아 不可諫而不諫하니 可謂不智乎아 知虞公之將亡而先去之하니 不可謂不智也니라 時擧於秦하여 知穆公之可與有行也而相之하니 可謂不智乎아 相秦而顯其君於天下하여 可傳於後世하니 不賢而能之乎아 自鬻以成其君을 鄕黨自好者도 不爲온 而謂賢者 爲之乎아 ------------------------------------------ 鬻 팔 육 百里奚 : 『莊子』 外篇의 田子方편에 “백리해는 작록을 마음에 두지 않았으므로 소를 먹여 소를 살지게 하고 진목공으로 하여금 그 천함을 잊고 더불어 정사를 하게 하였다(百里奚爵祿不入於心이라 故로 飯牛而牛肥하고 使秦穆公으로 忘其賤하고 與之政也라).”고 평가했다. 秦穆公 : 춘추오패의 하나가 된 군주로, 告子下편 제15장에 의거하면 百里奚를 저자거리에서 발탁했다(百里奚 擧於市)고 한다. 假道於虞以伐虢 : 『천자문』에 ‘假道滅虢’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춘추좌전』 僖公二年편을 보면, 晉의 순식이 굴 땅에서 나는 말 네 마리와 수극의 옥벽으로 우나라에게 길을 빌려 괵나라를 치겠다고 청하였다. 晉公이 ‘이는 우리의 보물이라.’고 했더니, 순식은 ‘만약에 우나라에게 길을 얻는다면 바깥의 창고에 두는 것과 같다.’고 대답했다. 공이 ‘우나라에는 궁지기가 있어 어렵다.’고 했더니 순식은 ‘궁지기의 사람됨이 나약하여 강하게 간할 수가 없고 또한 군주와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 군주와 친하므로 비록 간하더라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순식을 보내 우나라에게 길을 빌리도록 하니 우공이 허락하고 오히려 먼저 괵나라를 치겠노라고 요청했다. 궁지기가 간했으나 듣지 않고 마침내 군사를 일으켰다. 여름에 晉의 이극과 순식이 군사를 통솔하고 우나라의 군사와 만나 괵나라를 치고 하양을 멸하였다. (노나라 희공 5년에) 晉侯가 다시 우나라에게 길을 빌려 괵나라를 쳤다. 이때 궁지기가 ‘괵은 우나라의 거죽이니 괵이 망하면 우는 반드시 따라 망할 것이니 진나라에게 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도적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한번으로도 심하거늘 또 다시 내주렵니까? 속담에 덧방나무와 수레가 서로 의지하고 입술을 잃으면 이가 시리다고 하는 것은 우와 괵을 이릅니다.’고 하면서 길을 내주지 말 것을 간했으나 虞公은 듣지 않고 晉의 사신에게 길을 허락해주었다. 궁지기는 그 가족과 함께 우나라를 떠났다. 겨울인 12월 병자일 초하루에 진나라가 괵을 멸함에 괵공 추가 周나라의 서울로 달아났다. 진의 군사들이 돌아오면서 우나라에서 머물렀고, 마침내 우를 습격하여 멸하고 우공을 잡았다(晉荀息이 請以屈產之乘과 與垂棘之璧으로 假道於虞以伐虢이라 公이 曰是吾寶也라 對曰若得道於虞면 猶外府也라 公이 曰宮之奇存焉이라 對曰宮之奇之爲人也 懦而不能強諫하고 且少長於君하여 君暱之하니 雖諫이나 將不聽이라 乃使荀息假道於虞하니 (중략) 虞公許之하고 且請先伐虢이라 宮之奇諫이나 不聽하고 遂起師라 夏에 晉里克과 荀息이 帥師하고 會虞師하여 伐虢하고 滅下陽이라 (노나라 僖公五年에) 晉侯復假道於虞以伐虢이라 宮之奇諫曰虢은 虞之表也니 虢亡이면 虞必從之하니 晉不可啓요 寇不可翫이라 一之謂甚이어늘 其可再乎아 諺에 所謂輔車相依하고 脣亡齒寒者는 其虞虢之謂也라 (중략) 弗聽하고 許晉使라 宮之奇以其族行이라 (중략) 冬十二月 丙子朔에 晉滅虢에 虢公醜 奔京師라 師還館于虞하고 遂襲虞하여 滅之하고 執虞公이라). 自好者 : 스스로 자기 몸을 사랑하는 자 成其君 : 그 군주에게 나아가 패업을 이루게 한다는 뜻 ---------------------------------------------------------------------------------- 이윤이 때를 만나지 못하여 유신씨의 奴僕으로 밭을 갈았고, 백리해가 때를 만나지 못하여 소를 키웠으나 모두가 낙천지명의 도를 알기에 맡은 바 일들을 성실하게 해냈다. 때가 그칠 만하면 그치고, 때가 행할 만하면 행하여 동정에 그 때를 잃지 않아 그 도가 빛날 뿐이다(時止則止하고 時行則行하여 動靜不失其時하니 其道光明이라 - 『주역』 重山艮卦 彖傳). 이를 알지 못하는 好事家들은 백리해에 대해 스스로를 희생을 기르는 사람에게 양가죽 5장을 받고 팔아 이를 밑천으로 소를 잘 키워 목공의 눈에 띄게 했고, 이를 기회로 벼슬자리를 잡았다고 빈정거렸다. 맹자는 당시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명쾌하게 선을 그어 말했다.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군주에게는 도가 통하지 못함을 알기에 간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하고 다른 나라로 피해온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겠느냐는 반문이다. 더욱이 당시 백리해의 나이는 70이었다. 누추한 일이라도 천명이려니 하고 남은 여생을 다하면 그뿐이었다. 爵祿에 무슨 욕심이 있겠는가? 70의 나이는 ‘從心所欲不踰矩(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는다. - 『논어』 위정편 제4장)’이다. 진목공이 백리해를 먼저 알아보고 발탁했기에 크게 공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앞장에서도 언급했지만 맹자는 철환주유를 접고 제자들과 함께 글을 정리하면서 스스로 먼저 나서서 제후를 만날 일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더 이상 도를 펼 수 없는 세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맹자는 만장상편 제8장과 제9장에서 이윤과 백리해를 통해 왕도를 펼 의지가 있는 군주가 예로써 초빙한다면 다시 세상에 나서서 도를 펼 뜻이 있음을 은연중 담아냈다.